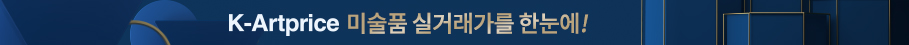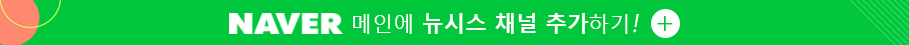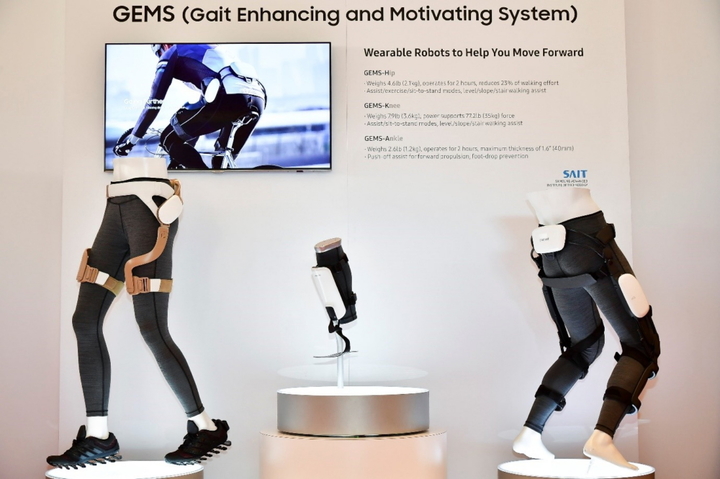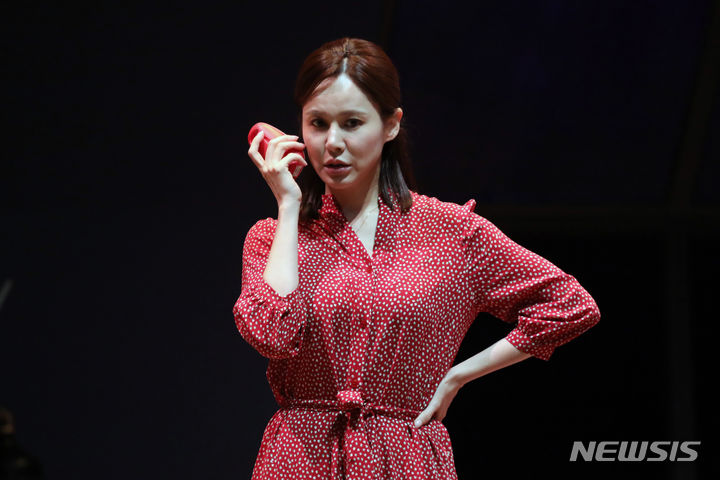미중 극적 휴전…가전기업들, 물류비 리스크 주시
미중 좁아진 뱃길에 물류비 단기 인상 가능성 제기
물동량 일시 회복될 경우 병목현상·운임 상승 유발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구에 지난 15일 한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다. 2025.04.28.](https://image.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00261421_web.jpg?rnd=20250428130444)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구에 지난 15일 한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다. 2025.04.28.
관세 유예 기간 양국의 물동량이 일시에 증가할 경우 운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정책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각 12일 공동으로 발표한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 이후 물류 비용의 단기 급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이 지난달 중국에 관세 전쟁을 걸기 시작한 이후, 양국 기업들은 오가던 뱃길을 돌려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망 분석회사 비전(Vision)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미국발 중국행 컨테이너(TEU)는 주간 예약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2% 감소했다. 이 회사가 관련 통계를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 수준이다.
중국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인 롱비치 항구로 가는 오는 6월분 TEU 주간 예약량도 주차별로 전년 대비 70.1%에서 최대 90.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운 업체들도 수요 감소로 아시아와 미국 서해안을 오가는 노선을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 속도와 관세 인하 폭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는 평가를 내린다. 양측은 보복관세 부과을 해제하고, 90일간 추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제품 선적하려는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 병목 현상과 운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에도 관세 인상에 앞서 대대적인 물량 밀어내기에 나서며, 해상 운임 상승을 유발한 전력이 있다. 관세 인상 전 미국에 제품을 보내기 위해 컨테이너선 싹쓸이에 나선 결과다.
운임 상승 여파는 이웃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지난해 쓴 물류비는 2조9602억원과 LG전자는 3조111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1.9%와 16.7% 증가했다. 이는 가전 업체들의 실적 둔화로 곧장 이어졌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컨테이너선 앞에 미국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 2025.04.03.](https://image.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0227714_web.jpg?rnd=20250403065009)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컨테이너선 앞에 미국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 2025.04.03.
업계 관계자는 "앞서 트럼프 1기 때도 미중 양국이 서로 관세와 보복관세를 주고 받다 합의에 이른 지난한 과정을 고려하면 아직은 미중 합의를 낙관하긴 이른 상황"이라며 "물류비 리스크에 대비해 시장별, 제품군별 선사 다변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정세를 보이던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가 단기 상승세를 보일 개연성이 크다.
상하이거래소에 따르면 SCFI는 이 지수는 올해 1월(2505) 초부터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나오기 전 3월21일(1319)까지 빠른 속도로 하락한 뒤 횡보하고 있다.
그러다 이달 9일 1345.17로, 전주(1340.93) 대비 4.24포인트 반등하며 4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물동량이 가장 급감했던 중국발 미서안 운임이 3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관세분쟁과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을 이용해 운임을 올릴 경우 팬데믹 물류대란, 홍해 사태 때처럼 물류비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